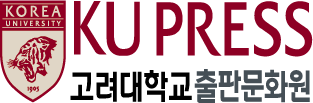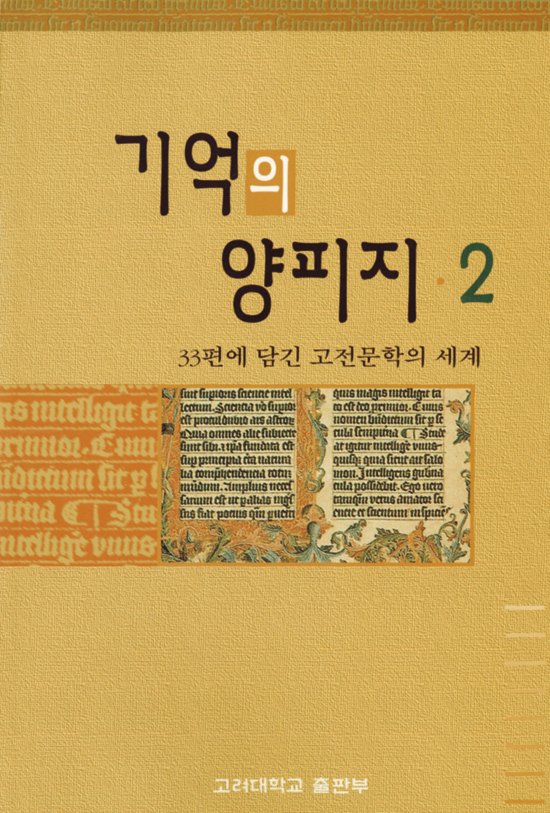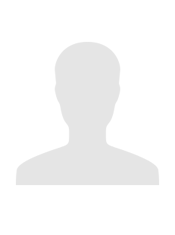“기억의 양피지”는 제 스스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인 것이 아니다. 누군가가 찾기 전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, 그저 바라보아 주기만을 원하는 수동적인 것이다. 분명, 우리가 보내는 일상적인 삶의 나날들 속에 존재하지만, 애타게 소망하고 갈구하는 이들에게만 스쳐지나가는 “기억의 양피지”는 우리들 곁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를 수 없는 저 멀리에 자리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마법을 구사하고 있다. “기억의 양피지”에게 부여된 생명의 불길은, 기억하지 못하는 먼 옛날 바로 우리들 자신이 밝힌 횃불이며, 죽음의 손길 역시 우리 손안에 들어있다. 한 권의 책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다. 지식의 굶주림에 사로잡힌 이들의, 또 갈망의 목마름에 신음하는 이들의 희구의 염원을 통해 그 책의 생명력은 이어진다. 그러나, 어느 순간, “이 책이 읽히지도 않은 채 이름 없이 흙으로 썩어갈 때”가 오면, 양피지는 스스로의 효용을 잃어버린 채,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. 그 누구도 “더 이상 이 페이지들을 가슴에 꼭 끌어안지 않을 때” 양피지는 잃어버린 환상이 되고 만다. “기억의 양피지”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애원한다. “해묵은 먼지들로부터 이 작은 책을 들어올려, 다 해진 페이지들을 넘기고, 나를 읽어다오, 나를 죽지 않게 해다오!” 이 책은 여러 권의 책을 읽을 시간조차 없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내용요약의 해제도 아니며, 현학적인 지식의 도구 또한 아니다. 오히려 이 책은 원전으로 향하는 이정표의 시작일 뿐이며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하는 꼼꼼한 책읽기로의 초대장에 불과한 것이다. 이 책은 여러 독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한 순간을 제공해 주는 매개물인 것이다. 한 편의 영화, 아련한 선율, 은은한 향기 등을 통해,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찾는 그 행복한 순간의 재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책의 역할이며, 지적사고와 인간 의지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알 수도 없는 심연의 골짜기에서 마침내 우리의 뚜렷한 의식의 층위로 떠오르는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 책이 가진 단 하나의 소망인 것이다. 이러한 의미에서, 33편의 고전 명저들을 선별한 이 책은 수많은 보고를 간직한 “기억의 양피지”가 되는 것이다.
머리말
소포클레스의 ≪오이디푸스왕≫
단테의 ≪신곡≫
나관중의 ≪삼국지≫
보카치오의 ≪데카메론≫
W. 셰익스피어의 ≪햄릿≫
M. 세르반테스의 ≪돈 키호테≫
≪충향전≫
J.W. 괴테의 ≪파우스트≫
스탕달의 ≪적과 흑≫
F. 도스토예프스키의 ≪죄와 벌≫
L. 톨스토이의 ≪전쟁과 평화≫
Ch. 보들레르의 ≪악의 꽃≫
H. 입센의 ≪인형의 집≫
R.M. 릴케의 ≪시선(詩選)≫
이광수(李光洙)의 ≪무정(無情)≫
단편소설 15선
T.S. 엘리엇의 ≪황무지≫
한용운의 ≪님의 침묵≫
E. 헤밍웨이의≪무기여 잘 있거라≫
염상섭의 ≪삼대≫
A. 말로의 ≪인조인간≫
J.P. 사르트르의 ≪구역(嘔逆)≫
A. 카뮈의 ≪이방인≫
S. 베케트의 ≪고도를 기다리며≫
徐廷柱의 ≪국화 옆에서≫
아리스토텔레스의 ≪시학≫
J. 스위프트의 ≪걸리버 이행기≫
G. 플로베르의 ≪보바리 부인≫
V. 위고의 ≪레 미제라블≫
E. 졸라의 ≪목로주점≫
마르셀 프루스트의 ≪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≫
H. 헤세의 ≪데미안≫
최인훈의 ≪광장≫